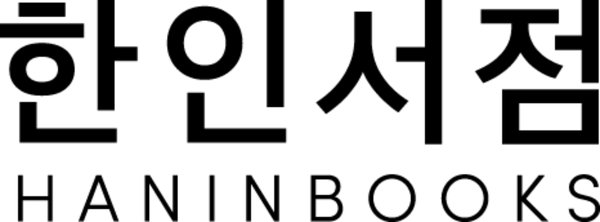맹자, 공자를 계승하여 유가 사상을 확장하다
- 동아시아 사상사의 관점에서 본 맹자의 위상
성리학의 창시자 주희는 공자로부터 비롯한 유가의 도통이 증자, 자사, 맹자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들의 사상은 유가의 정통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동아시아의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공자의 《논어(論語)》, 맹자의 《맹자(孟子)》, 증자의 《대학(大學)》, 자사의 《중용(中庸)》이 ‘사서(四書)’로 불리며 조선 및 동아시아 정치·사회·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경전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맹자는 공자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유가 사상가로 꼽히는 위대한 인물이다. 유가 사상을 ‘공맹사상’이라 부르고, 그를 ‘공자 다음가는 성인’이라며 아성(亞聖)이라 일컫는 등 맹자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무수히 많다.
일반인에게는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했다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나 인간은 누구나 측은해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성선설(性善說)’로 널리 알려졌지만, 사상사의 측면에서 맹자의 위치는 이보다 훨씬 높다. 맹자는 단순히 공자를 계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사상을 재해석하여 유가의 학문 체계를 확장했으며, 왕도정치·역성혁명·측은지심·호연지기·여민동락 등 다양한 정치적·도덕적 개념을 만들었다. 또한 그는 양주나 묵적 등의 사상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비판했으니, 동아시아 사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맹자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맹자는 공자의 위대한 면모를 되새기면서 자신이 성인 공자의 문하로서 학문을 익힌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성인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의 큰 세계를 보았으니, 본인의 시야 확장은 공자의 공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맹자의 사상은 공자의 사상을 사숙했고, 스스로 계승자로서 자부한 것은 사마천의 지적대로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게 배워 도통을 이었다는 것이겠지만, 여기에는 차별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즉 맹자는 공자의 인성론과 교육관을 재해석하면서 천명과 역사에 대한 자신의 사상 체계를 확장했다.
- ‘해제’ 중에서(23~24쪽)
탐욕의 시대에 필요한 이상 정치를 논하는 고전 《맹자》
- 왕도정치, 역성혁명, 여민동락... 《맹자》의 핵심 개념이 전하는 파격적 정치사상
맹자와 그의 제자 만장, 공손추 등이 함께 지은 책 《맹자》는 이상과 현실이 어우러진 정치사상을 담았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맹자가 활동한 전국시대 중기는 전쟁이 매우 치열한 시기였다. 위정자들은 부국강병만을 추구하며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일에 매진했다. 이 같은 혼돈의 시대에 맹자는 양나라 혜왕과 제나라 선왕(제1~2편 〈양혜왕 상·하〉), 제나라 위왕(제4편 〈공손추 하〉), 등나라 문공(제5~6편 〈등문공 상·하〉) 등 전국 각지의 군주들을 찾아다니며 덕정(德政)과 인정(仁政)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맹자가 꿈꾼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맹자 사상의 핵심 개념인 왕도정치, 여민동락, 역성혁명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맹자의 ‘왕도정치(王道政治)’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 정치를 말하는데, 이를 위해 군주는 도덕성을 갖춰야 하고, 백성에게 경제적 안정을 주며,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해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 군주가 지배층만이 아닌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해야 한다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자세는 지금 읽어봐도 상당히 파격적인 생각이다. 나아가 패악한 군주는 인과 의를 저버린 사내에 불과하므로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은 유가의 도(道)가 내포하는 민본사상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봉건사회라는 시대적 제약마저 뛰어넘는 혁명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언뜻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맹자의 이상 정치는 법에 근거한 세금 징수, 정전제 회복을 통한 조세법 추진, 교육 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재 양성 등 치밀한 법적·제도적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비록 맹자의 사상이 당시 군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3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상가와 정치가가 《맹자》를 읽고 곱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맹자의 유세는 고행의 연속이었다. 등나라에서도 자신의 정치 이상을 실현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일흔이 거의 될 무렵에 양나라 혜왕을 만나게 된다. 그 내용이 바로 《맹자》 첫 편 첫 장에 나오는 혜왕과 맹자의 대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 왕들의 관심거리는 오직 ‘이익〔利〕’ 한 단어에 있었다. 물론 맹자는 제나라에서 객경이란 벼슬을 하기도 했는데(제3편 〈공손추 상〉 1장), 맹자의 사상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늘 전쟁만 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에 머물렀다. 스스로 객경의 자리를 내놓으려 했을 때 제나라 선왕이 만류하기도 했으나 맹자의 실망감은 극에 달했고 그때 이미 일흔이 넘은 나이로 고국으로 돌아와 제자인 만장, 공손추 등과 함께 《맹자》를 완성하게 된 것이다.
- ‘해제’ 중에서(19쪽)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죽이는 데] 칼날로 하는 것과 정치로 하는 것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왕이] 말씀하였다.
“다른 점이 없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의] 푸줏간에는 살진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진 말이 있는데도 백성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것은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형국입니다.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도 사람들은 그것을 미워하는데, 백성의 부모가 되어 정치를 하면서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형국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찌 백성의 부모 노릇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으로 나무 인형을 만든 자는 아마도 후손이 없을 것일진저!’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람의 형상을 장례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을 굶주려 죽게 한 것은 어찌해야 합니까?”
- 제1편 〈양혜왕 상〉 중에서(43~44쪽)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중략) 지금 왕께서 여기서 음악을 연주하시는데, 백성이 왕의 종소리와 북소리, 피리 소리를 듣고는 모두 흔쾌히 기쁜 얼굴빛으로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께서 아마도 병이 없으시겠지. 어찌 이렇게 음악을 잘 연주하시는가?’라고 하고, 지금 왕께서 여기서 사냥을 하시는데, 백성이 왕의 수레와 말의 소리를 들으며 깃발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모두 흔쾌히 기쁜 얼굴빛으로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께서 아마도 병이 없으시겠지. 어찌 이렇게 사냥을 잘하시는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백성과 함께 즐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께서 백성과 함께 즐기신다면 [훌륭히] 왕 노릇 하실 것입니다.”
- 제1편 〈양혜왕 하〉 중에서(66~67쪽)
제 선왕이 물었다.
“탕왕이 걸왕을 추방했고 무왕이 주왕을 정벌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전해오는 문헌에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왕께서] 말씀하였다.
“신하가 그 군주를 시해했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고 하고, 의로움을 해치는 자를 ‘잔’이라고 하며, 잔적한 사람을 ‘한 사내’라고 하니, 한 사내인 주를 주살했다는 말은 들었지,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 제2편 〈양혜왕 하〉 중에서(83쪽)
《맹자》 출간으로 〈김원중 교수의 명역 고전〉 시리즈를 마무리하다
- 성황리에 완간하는 서점가의 대표 동양고전 시리즈
2016년 출간을 시작한 〈김원중 교수의 명역 고전〉 시리즈는 지금까지 《논어》, 《손자병법》, 《한비자》, 《대학·중용》, 《노자 도덕경》, 《명심보감》, 《채근담》, 《정관정요》 등 8권의 책이 출간되었으며, 《맹자》 출간을 마지막으로 완간되었다. 5년 동안 시리즈 누적 1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서점가의 대표 동양고전 시리즈로 자리를 잡은 〈김원중 교수의 명역 고전〉 시리즈는 이제 독자들이 믿고 구입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이번에 출간한 《맹자》 또한 원문을 왜곡하지 않고 유려한 우리말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 전체 내용을 개괄하고 독서의 방향을 잡아주는 해제와 해설을 담았다. 조기, 주희, 초순, 정약용, 양보쥔 등 고금 주석가·학자의 성과를 두루 반영한 820여 개의 풍부한 각주는 넓고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이룬 학술적 성과인 동시에, 일반 독자들도 《맹자》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난해할 수 있는 동양고전 이해를 돕는 〈김원중 교수의 명역 고전〉 시리즈는 앞으로도 옛사람의 지혜를 배우려는 독자들이 꾸준히 읽는 책으로 오래 남을 것이다.